이언 매큐언, 『속죄』(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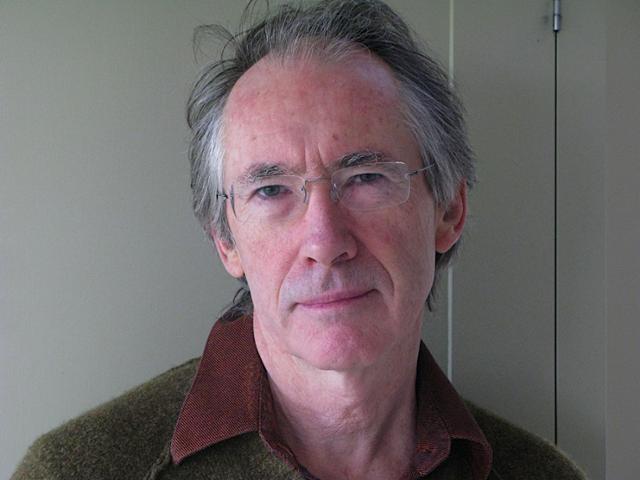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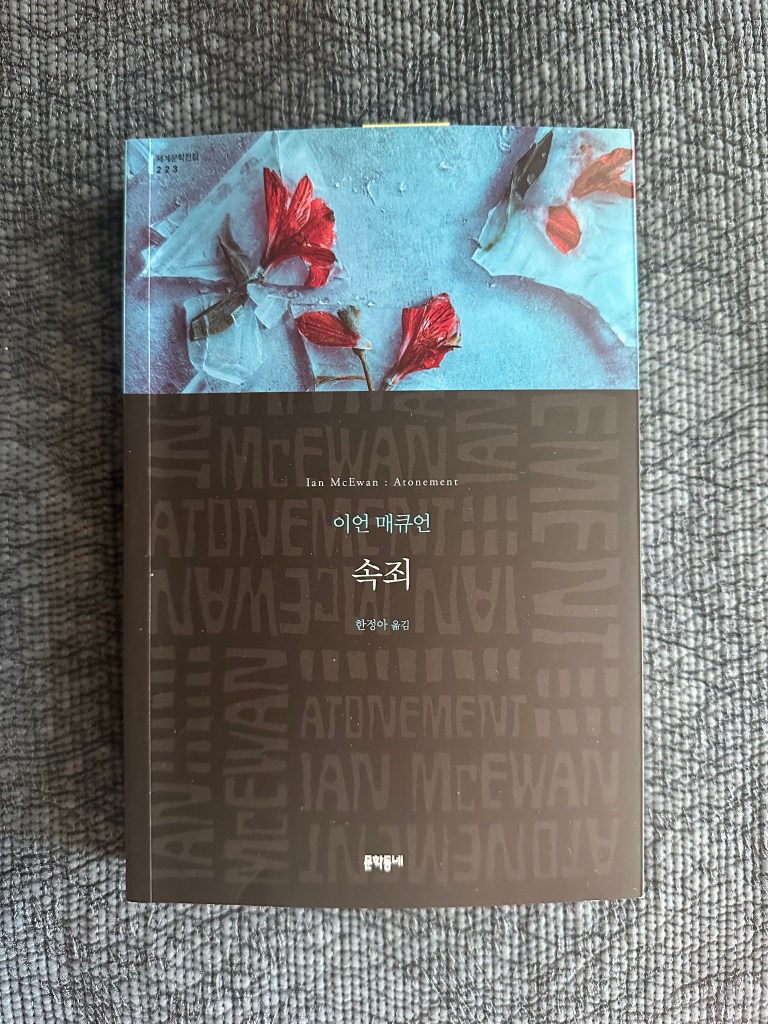
그녀는 ‘내가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다’는 고백을 하면서, 독자에게 자신을 도덕적 주체로 인식시키려는 효과를 만든다. 현실에서는 로비와 세실리아가 비참하게 죽었지만, 소설 속에서는 그들을 재회시키며 ‘이렇게라도 행복하게 해줬다’고 말한다. 이것은 일종의 감정 조작이자 자기 위안이다. 그 폭로는 피해자가 이미 죽고, 본인도 치매로 기억이 사라지기 직전이라는 시점에 나온다. 실질적인 구제는 전혀 없다. 아니, 치매로 기억이 사라지기 직전까지도 기만 속에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브라이오니는 결국 속죄의 불가능성을 자신의 기만으로부터 깨닫는 것이다.
사실 나는 이 소설의 첫 장면에서부터 이 작품이 글쓰기에 대한 메타 소설이자, 글쓰기의 속죄 불가능성을 강력하게 예고하고 있다고 여겼다. 그녀는 글쓰기를 통한 공상의 희열은 그 공상으로부터 현실로 복귀하는 쓰라린 대가를 치름으로써야 비로소 획득되는 쾌락이라는 것을 애초에 이미 알고 있었다. 글쓰기는 자기만의 비밀을 만들어내면서 세상을 축소해 손안에 넣는 즐거움을 맛보게 한다. 그렇기에 그녀는 희곡보다 소설을 더 좋아한다. 이유는 소설에서는 제한된 자원 때문에 애태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상상하고 바라는 대로 글을 쓰기만 하면 그 자체로 완벽한 세계가 탄생한다. 희곡은 현실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로 만족해야 했다. 무대, 배우, 조명, 음향까지 모든 것이 마음대로 구성되는 것은 너무 힘들다. 어쩌면 그녀는 소설의 위치를 자신의 내면처럼 다른 글쓰기 형식으로부터 독립시켜 독단적인 위치에 놓았던 것 같다. 소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위에 있는 글쓰기였다.
더군다나 그녀는 로비를 두고 자신과 세실리아가 사랑의 경쟁이라도 벌이는 듯이 생각했는데, 그 끝은 결국 자신이 로비를 죄인으로 만들고 세실리아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독단적인 시점은 자신을 고립시키면서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러한 글쓰기의 결과는 소설 속 출판사의 평에서도 드러난다. “당신의 소설에는 척추가 필요하다!”(449) 브라이오니의 속죄 글에는 척추, 곧 하고 싶었던 말, 아니 반드시 했어야만 하는 속죄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소설 속에서 글로 하는 속죄뿐 아니라, 현실 속 행위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속죄가 완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로비와 세실리아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현실의 속죄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을 통한 속죄의 길도 막혀 버린다. 현실 속에서의 속죄만이 완성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글의 속죄는 그것 자체로 영원히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 거꾸로 소설 속 속죄는 현실의 비극을 완성하는 셈이다.
“글쓰기”는 진실을 복원하는 도구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진실을 가리고 권력적으로 재구성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브라이오니는 작가로서 사건과 인물을 전적으로 통제한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들의 삶과 죽음을 자기 서사 속에 배치한다. 이것은 글쓰기가 가진 윤리적 위험을 드러낸다. 고통을 재현하면서, 그것이 실제 피해자의 고통이 아니라 작가의 예술적 성취로 소비되는 순간이다. 독자는 이 순간의 감정적 불편함을 마지막 페이지에서야 깨닫게 되고, 그때 비로소 이 세계의 모든 비극적 위선을 직면하게 된다. 이언 매큐언은 모든 글쓰기에 침을 뱉음으로써 글쓰기를 구원하려는 것인가.
그러나 나는 이언 매큐언이 브라이오니의 기만을 내세워 아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여겨졌다. 차라리 브라이오니가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저 ‘기만’이야말로 문학의 핵심적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모든 글쓰기는 이 기만으로부터 출발하고, 기만 속에서 헤매다가, 결국 기만을 고백도 속죄도 하지 못한 채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만을 부여잡고서야 글쓰기는 가능하다. 기만은 없애버릴 수도, 그렇다고 그것을 고백하여 속죄할 수도 없다. 나는 오히려 이 책을 읽고 진실의 글쓰기보다 기만의 글쓰기가 글쓰기의 진실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 주제야말로 글쓰기에 대해 새롭게 시작해야 할 진짜 이야기이다. 나는 어떤 기만으로 글을 쓰고 있는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