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들뢰즈, 『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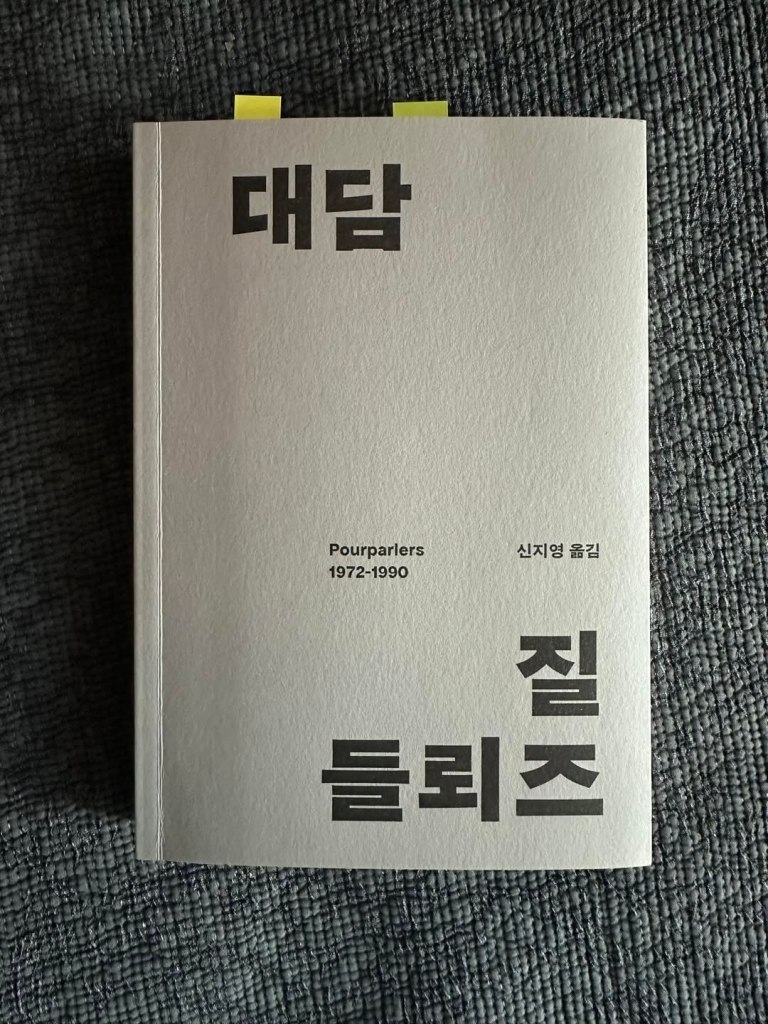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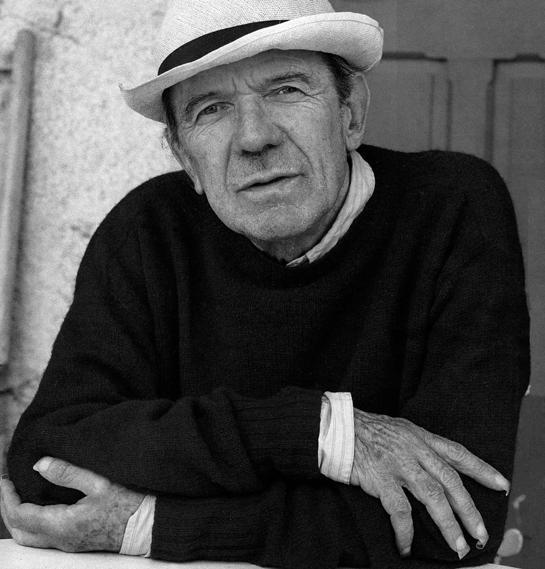
살면서 괴로움이라는 것과 마주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과 함께 살아낼 수 있을까. 특히 실패나 몰락, 혹은 엄청난 재난이나 사고를 겪고, 이른바 씻을 수 없는 심적 고통에 빠져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조차,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나 명랑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만일 그 방법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을 더 용기 있게 대면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들뢰즈는 푸코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주 명료하게 이 부분을 푸코의 철학 입장에서 설명해 준다.
푸코의 ‘주체화’는 이 평범한 문제의식과 직접 맞닿아 있다. 푸코에게 ‘주체’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성격의 사람인가?” 같은 질문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통해 생겨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체는 어떤 고정된 ‘자아’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형태인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늘 조용하고 말이 없다고 하자. 그래서 사람들은 “저 아이는 소극적인 성격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학생이 어느 날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을 보고, 갑자기 앞에 나서서 친구를 도와주고,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하며 정의를 요구했다고 하자. 이때 그 학생은 ‘소극적인 아이’라는 인격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순간, 자신의 몸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의 새로운 존재 양태를 만들어낸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사건과 만난 삶의 실험이다. 그는 이전까지의 자아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구성한 것이다. 이게 푸코가 말한 주체화에 가깝다.
결국 주체화란 어떤 고정된 정체성이나 완성된 인격의 형성이 아니라, 사건과 접촉하며 삶을 실험하고 변화하고 있는 상태 자체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성된 주체가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는 강도의 양태다. 주체화는 진행 중인 운동이지,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들뢰즈가 푸코의 주체화를 설명하면서 끊임없이 어떤 실체로서의 인격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기존과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인 상태. 앞에서 소극적인 아이였던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의 사건들과 접하면서 친구를 도와줘야겠다는 정념이 생성되어 행동에 나서는 과정이 바로 주체화이다.
그런데 이런 주체화가 이루어지려면 늘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해야 한다. 이 지점 앞에서 우리는 늘 사유의 한계를 시험받는다. 아주 이상한 지대인데, 그 상황에 도달하면 기존의 주체는 한계를, 특히 사유의 한계에 봉착한다. 이 사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사건과 접촉하며 삶을 실험한다는 뜻이다. 들뢰즈가 “한계를 넘어서 사유하고 실천하는 삶의 방식”에 관한 깊은 대화를 하면서, 여기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선’이다. ‘선’이라는 표현은 단지 공간적 구분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마주하는 극한 상태, 즉 삶과 죽음, 이성과 광기, 사유와 침묵 사이의 결정적인 경계’선’을 의미한다. 들뢰즈는 이 선이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너무 빨라서, 숨막히게 한다”고 말한다. 이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우리가 맞서야 하는 근대 이후의 세계, 즉 너무 많은 정보와 속도, 권력과 규율, 이미지와 목소리가 넘쳐나는 세계에서 정신이 붕괴하거나 사유가 무력해지는 한계 상황의 경험을 지칭한다. 앙리 미쇼의 마약, 에이하브의 편집증, 그리고 들뢰즈가 자주 말하는 ‘광기의 선’은 모두 그런 한계 경험을 상징한다. “그것은 단지 고래가 아니다. 그 너머에, 나는 어떤 의미를 본다.”
내가 늘 말하지만, 들뢰즈는 세계를 넘어가려는 자이긴 하지만(그는 모범적인 학생의 한계경험을 대표하는 철학자이다), 세계를 파괴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다. 들뢰즈는 푸코를 해석하는 대담에서 이 선을 무작정 넘거나 파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한다. 들뢰즈는 말한다: “선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서 푸코가 말한 ‘삶의 기술’(technē tou biou)이 등장한다. 선을 접고, 휘고, 그 위에 거주하고, 숨을 쉬고, 사유 가능한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곧 주체화의 기술이다. 내가 표현하기를 그것은 선과 함께 놀고, 선 위에서 춤을 추는 기술이다. 앙리 미쇼나 에이하브나 고호가 그 광기를 끌어안고 품어서(접고 휘며), 죽음 가까이에서 미학적 명랑성을 가지는 것(숨을 쉬고 사유가능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는)이다. 주체화란 나를 정체성으로 고정하는 일이 아니라, 선과 맞닿은 그 긴장과 위험 속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구성하는 실천이다. 이 경지에서는 타인의 인정조차 사라져 명예가 없는 시민이 된다. 그럼에도 한계경험의 공포를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기술.
이때 중요한 것이 ‘접힘(fold)’이라는 개념이다. 들뢰즈는 이것을 푸코뿐 아니라 라이프니츠, 하이데거, 심지어 루셀에까지 확장한다. 접힘은 한계를 안으로 끌어들여 자기 안에 공간을 만드는 것, 다시 말해, 삶이 무너지는 그 경계에서 삶을 견딜 수 있는 양식으로 다시 구성하는 것이다. 너무 빠른 세계에 맞서 ‘느린 존재’를 만드는 기술, 그것이 바로 철학이고 윤리이고 실존의 문제다.
푸코에게는 그것이 삶을 견디는 기술, 선을 따라 사유하는 방식, 그리고 주체화의 윤리적 실험이었다. 삶이 무너질 수 있는 그 극단의 지점에서, 어떻게 철학이 사유를 지속시키고, 어떻게 주체가 무너지지 않으며, 오히려 선을 휘고, 선에 거주하고, 다시 숨을 쉬게 만드는가를 묻고 있다. 그 실천이 바로 삶의 기술이며, 푸코 철학의 마지막 열쇠이자 들뢰즈가 보는 푸코의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다. 멜빌의 고래가 휘감고 가는 선, 미쇼가 마약 속에서 경험한 감각의 경계선, 고흐가 몰입 끝에 도달한 광기의 한계선—이 모든 선들은 지식이나 언어로는 온전히 다룰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외부성의 지평이다. 그 선을 무작정 넘어서면 실재로 죽음에 이르거나, 광기로 붕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화란, 그 선을 ‘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푸코는 선 위에서 숨 쉬는 법, 살아남는 법, 저항하는 법을 ‘삶의 기술’이라고 불렀다. 주체화란 그저 윤리적인 태도나 도덕적 자기훈련이 아니라, 바깥과 접촉한 채로 살아남기 위한 미학적·정치적 구성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댓글 남기기